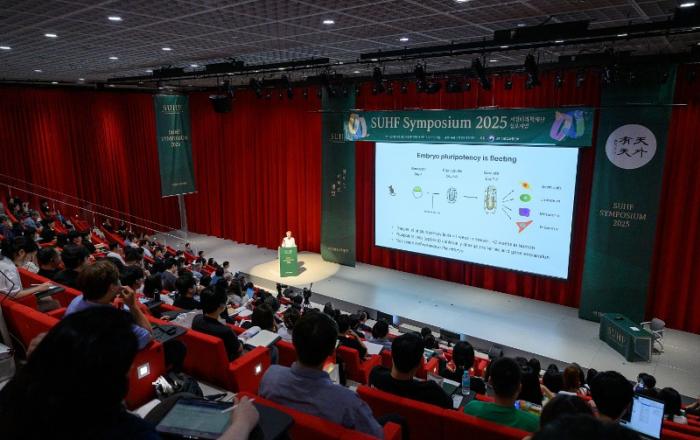아직 추운 2월이었는데도 나는 벌써 봄이 올 낌새를 코끝에서 느끼고 있었다. 겨울의 차가움 속에서도 피어나는 강렬한 봄의 기억, 아니 몸의 반응이 오래 전의 그 봄을 또 소환하는 것이다.
학교 졸업을 앞둔 파릇한 간호대학생이 취업을 위해 호기롭게 넘던 신촌의 그 굴다리도 있지만, 가장 강렬한 봄의 기억 중 하나는 병원에서 근무를 끝내고 나오면 마주치던 5월 꽃밭의 정경들이다. 봄바람으로 가득 찬 가슴이 하늘로 날아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청춘의 봄 말이다.

간호학!
범-인류애적인 학문으로 똘똘 무장한 나는(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얼마나 귀여운 치기였던가 말이다.) 병원의 확장 이전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 약 3달을 대기하며 서초동 꽃동네에서 아버지를 따라 잠시 꽃을 파는 아가씨로 분했다.
팬지, 패스츄리, 이름도 귀여운 퐁퐁데이지, 베고니아~ 청춘의 길목에서 잠시 ‘꽃 파는 아가씨’가 됐던 경험은 아름다운 내 추억의 조각이다. 취업 후 허락된 달콤하고 행복한 3개월의 여유를 나는 마음껏 즐겼다.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불어 닥칠지는 까마득히 모른 채 말이다.
5월이 됐다.
첫 근무부서는 내가 원했던 신생아-중환자실(이 또한 얼마나 겁도 없는 선택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도 필요치 않았다).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듯, 조그만 입을 벌려 밥 달라고 혹은 똥 쌌다고 목청껏 울어대는 Well-baby 룸은 차라리 평온한 방이었다.
신생아 중환자실!
말만 들어도 겁나는 그곳에서, 나는 주먹만 한 아가들의 두피 태지를 닦아가며 링거를 잡아야 했고, 온갖 기계들의 삑삑-소리와 수시로 울어 대는 알람 소리, 황달을 없애기 위한 형광 불빛 아래에서의 인큐베이터 수유까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아무리 범-인류애적인 학문으로 똘똘 무장했다 하나 그곳은 그 여린 방패 하나로는 어림도 없는 엄청난 곳이었다.
선배의 태움도 물론 단단히 한몫을 했지만.
그 모든 ‘질풍노도’를 젊음의 패기 하나로 뚫고 나아갔다니 참으로 용감하고 가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전투력 뿜뿜의 Day 근무를 마치고 병원 건물을 나서는 순간은,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눈 앞에 펼쳐지며 강렬한 자유와 행복을 선사해주는, 그야말로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업무의 치열함도 한 방에 날릴 만큼 아름다운 꽃잎들이 ‘앞으로 펼쳐질 나의 삶이 연분홍빛’이라고 착각(!)했던 그야말로 청춘스러운 나의 의식과 만나, 나의 영혼을 하늘 높이 끌어올렸던, 미칠 듯이 아름다운 그 순간들이었던 것이다.
응급실 앞마당의 목련은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를 부르며 베르테르를 읽고 싶게 만들었고, 영산홍 꽃밭은 마치 내가 꽃인 양 함박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그렇게 ‘가운 입은 뽀글이 파마의 젊은 나’의 사진은 한동안 화장대 유리 밑에서 웃고 있었다.
그 청춘의 봄꽃은 그래서 지금도 여지없이 나의 봄 기억과 정서를 소환하고 있으며, 2월 말의 차가운 바람에서도 나는 봄의 낌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다.
아~ 그 봄이 또 오려는구나!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희진 서울지향초등학교 보건교사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