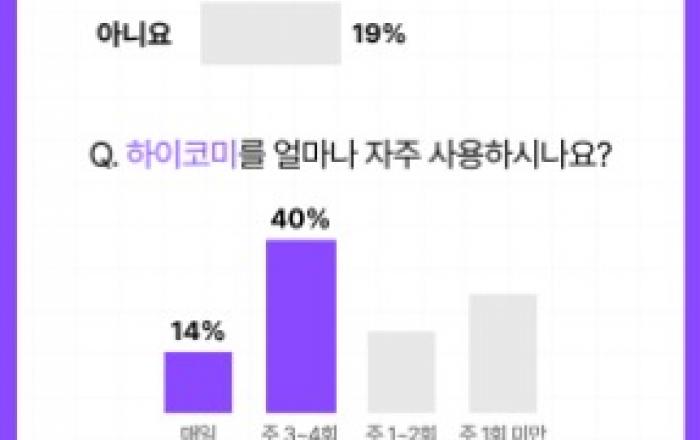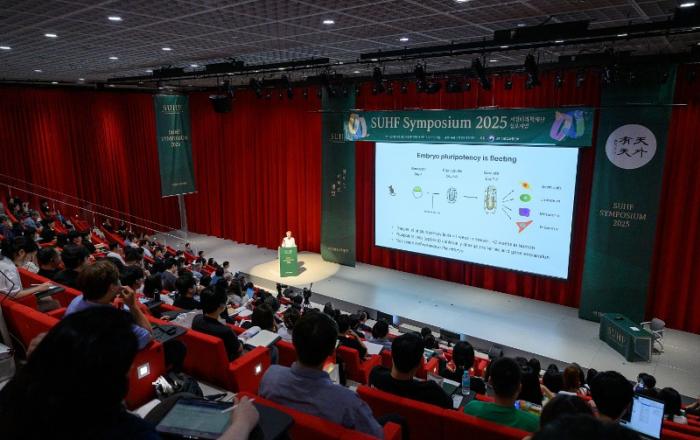오늘은 1학년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의 인도 하에 학교의 이곳저곳을 돌며 장소를 익히는 날이었다.
“얘들아 잘 봐! 여기가 아플 때 오는 보건실이에요! 보건 선생님께 인사해야지?”
귀여운 병아리들이 합창을 한다. “안녕하세요오~~~”
어흑… 이쁜 녀석들 같으니라고! 병아리들을 맞이하러 버선발로 달려 나간다.

그런데, 그마저도 병아리들에겐 힘든 여정이었던가 보다. 2명이 동시에 다리가 아프다고 한다.
담임선생님이 앞으로 갈 길이 머니(!) 보건실에 좀 쉬게 해달라기에 둘을 보건실 소파에 앉혀 두고, 나는 컴퓨터 모니터를 열심히 째려보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중 한 아이가 무어라 웅얼거린다.
응? 뭐라고 말한 거니?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흑흑…”
눈에는 벌써 눈물이 한가득 고였다. 울음보가 터지기 직전. 순간 깜짝 놀랐다.
‘아니 벌써! 저렇게 선생님과 정이 들었어?’
아니지! 보건교사는 알고 있다. 처음 접하는 학교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나를 품어주는 엄마 닭 선생님이 눈앞에서 사라졌고, 나는 고립되어 고아가 된 것 같은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어머 그랬쪄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하면 바로 울음바다가 될 건 자명한 일.
나의 할 일은 진화 작업(불이 난 감정에 찬물 끼얹어 식히기)이었다.
아~~ 그래? 근데 왜 울어? 울 일은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평안하게 반응해주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려던 찰나, 보건 선생님의 진화성 멘트에 뻘쭘해졌는지 울음을 멈추었다.
“네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쉬고 있는 거고, 옆에 친구랑 조금만 놀고 있으면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다른 데 다 돌고 나서, 금방 오실 거야”
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다리면 선생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 이 애기들을 어쩜 좋다니! 아장아장 유치원을 졸업하고 덩치가 큰 학교에서의 생활이 낯설기만 할 터.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의 반은 가리고 있으니 바깥 세계가 더더욱 무섭다.
그러나, 이젠 유치원생이 아닌 어엿한(!) 학생이다.
아무도 부여하지 않은 엄청난 사명감으로, 오늘도 이 보건교사는 1학년 병아리들을 상대로 거창한 작전(!)을 시작한다.
‘지금 여긴 어디고(유치원이 아닌 학교다),
나는 누구이며(유치원생이 아닌 어엿한 1학년이다),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다리가 아프다고 했으니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쉬면 된다)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통해 저~ 앞의 등대(선생님과의 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야지!’
저 아이들은 모른다.
자신들을 대하는 보건 선생님의 대응에는 철저히 계산된 이런 목적이 깔려있음을.
그리고 자라나서도 모를 것이다.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지금의 훌륭하고 멋진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모르면 또한 어떠리! 큰 나무가 되어 자라기만 하면 그만인 것을!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작권자 ⓒ 한국건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희진 서울지향초등학교 보건교사
[email protected] - 다른기사보기